사실 맨날 논문 쓸 시간만 없지 뭐


































2년 전, 독서모임을 하는 친구들과 필름 카메라를 들고 제주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바다를 보자마자 셋 다 셔터를 눌러댔고 우리는 현상하면 똑같은 사진만 가득할 거라며 키득댔다. 집에 돌아가는 길. 서로 공유한 사진을 보다가 모두가 마주하는 똑같은 풍경을 다르게 만들려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슬아 작가님의 개인전 <CONCRETE GARDEN>을 보면서 그때의 생각이 떠올랐다.
"책 마무리 겸 새 전시 미팅 겸 겸사겸사 떠난 뉴욕에서 팬데믹을 맞았다. (...) 마치 도시가 텅 빈 것처럼. 마침 봄이 와서 도시는 꽃밭인데 알 수 없는 공기로 가득했다. 꽃들이 눈치 없이 화사한데 그 누구도 꽃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 결국 그 도시를 채우고 만드는 건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걸. 뉴욕의 벚꽃은 핑크빛이 아니었다." _ 이슬아, 《THINGS IN CITY》(Maker Maker, 2021) 중에서
작가님의 작품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림의 콘텍스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도시의 콘텐츠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매일의 감정을 충실하게 느끼며 생생하게 삶을 감각하는 듯 보였다. 전시장 안에서 가본 적도 없는 뉴욕을 여행하며 그곳에 놓인 인물들의 감정과 대화를 상상했다. 상상은 대체로 경험에 기반하게 되어서. 먼 타지의 이름 모를 사람들에 나의 일상 곳곳의 이야기가 덧입혀졌다.
콘크리트를 연상하게 하는 인테리어 요소와 붉은 벽돌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의 초록을 지닌 갤러리 공간은 전시 테마와 어우러지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 전시 관람의 말미엔 작품 속 풍경의 일부가 되고 싶은 그림 앞에 서서 작가님의 책을 주문했다. 잿빛 도시에서의 일상은 그 속에 놓인 '우리'의 존재로 매일 충실하게, 그리고 꽤나 감도 높게 채워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감각하고 싶어서.
_
그런데 요즘 예전부터 좋아하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그 시장을 넘어 갤러리라는 새로운 마켓으로 진입하는 걸 자주 보게 된다. 물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이겠지만 요즘에는 좀 '대거' 일어나고 있는 너낌적인 너낌. 한국 아트마켓이 불장인 것도 한몫했을 것 같고, MZ 컬렉터가 부유층과 투자층, 일반층으로 나뉜다면 부유층과 투자층이 아예 시장의 블루칩 작가 작품들을 사들이는 동안 일반층은 조금 더 취향 기반의 신진 작가들 작품을 소비하는 듯 보이는 것도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 '대거'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세대교체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몇 년 전부터 문학계에서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작가들의 활약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고 해당 독자층이 문화의 주요 소비자로 자리잡았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 지금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비슷하지 않을까. 언론에서 주로 비춰지는 인플루언서 컬렉터들이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소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일 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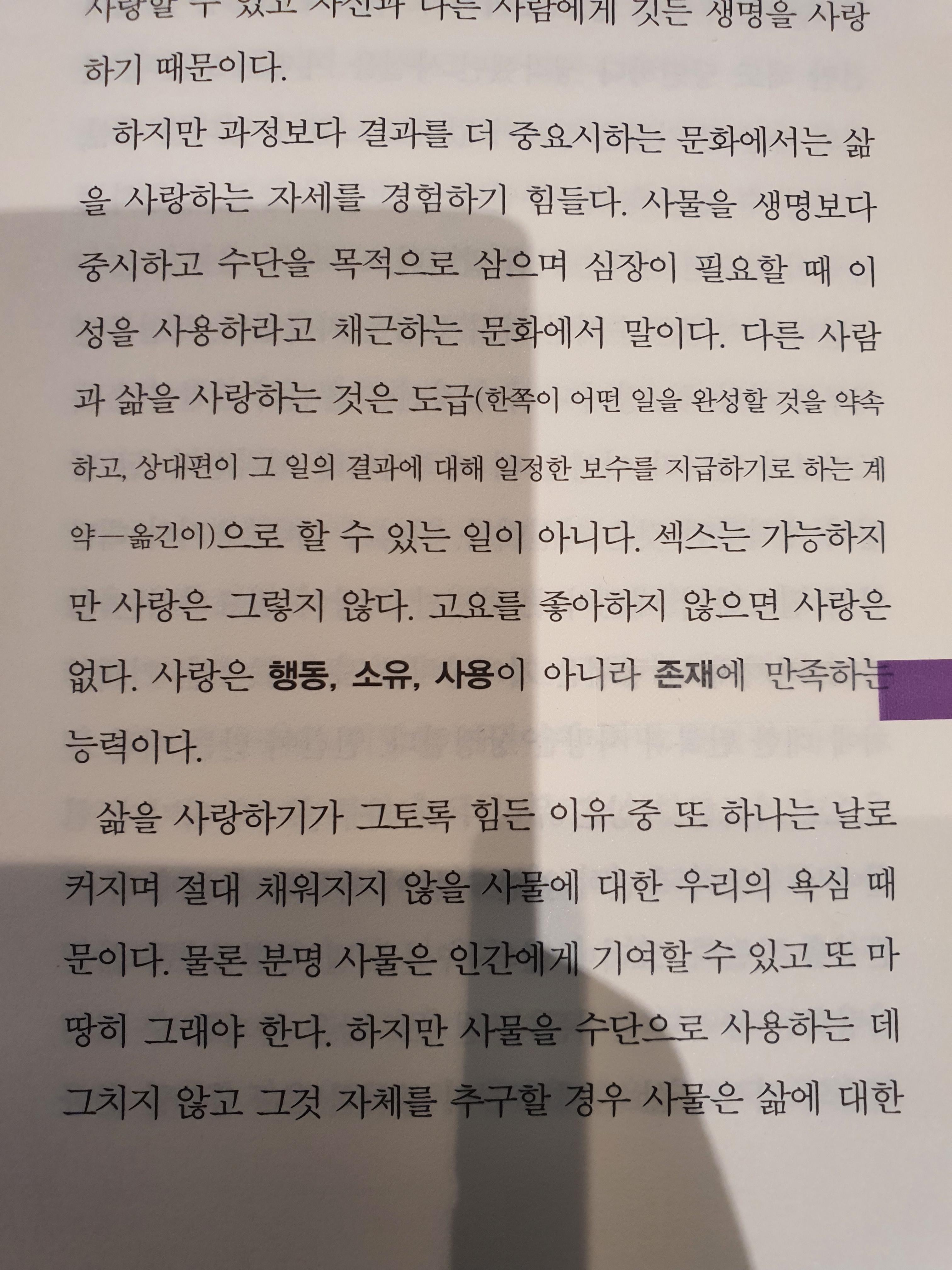
소격동 갈 때면 들르는 방앗간에 들러서 바누텔라 먹으면서 에리히 프롬의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너무 좋던데.






캔버스를 묶어버린 이승택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설명문에서 "이 공간의 관전 포인트는 재료의 본래의 성질과 상관없이 물렁물렁해 보이는 작업들을 마주하는 우리의 눈과 뇌 사이의 거리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감상에는 실패했다. 굳어버린 사고 만큼이나 단단하게 느껴지는 작품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 물체들이에 줄이 지나갈 고랑을 냈지?' 하고 감탄이나 했지 뭐야, ... ;_ ;

아니 퐁대에 생긴 다운타우너, ... 뜨생만 아니었으면 달려갈 뻔했다.




이번 뜨생 좀 최고의 난제였다. 좀 가볍게 가보려고 선택한 영상 콘텐츠였는데 질문을 뽑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서, ... 진심으로 이번에는 그냥 근황토크나 하고 끝내자! 할까 천오백 번 고민함. 그래도 어찌저찌 끝냈네.

원래 염색은 적어도 네 달 텀을 두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다시 미용실에 달려갔다. 애쉬가 빠져버린 자리에는 빗자루 노란색만이 남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도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제발 빗자루 노란색만 아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한 번도 자신이 해준 스타일링과 이후의 과정에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던 사람이 이런 문제를 들고 오자 원장님은 조금 당황해하면서 수습을 해주셨다. 저는 대체로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고 웬만하면 그 결과에도 만족하는 편이지만 빗자루 노랑은 정말 참을 수 없었읍미다요,... 휴. 꽉 찬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사실 맨날 논문 쓸 시간만 없지, 뭐.'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