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Bossanova,
20240426-27_닿고 싶은 곳이 있으면 기꺼이 길을 나서는 사람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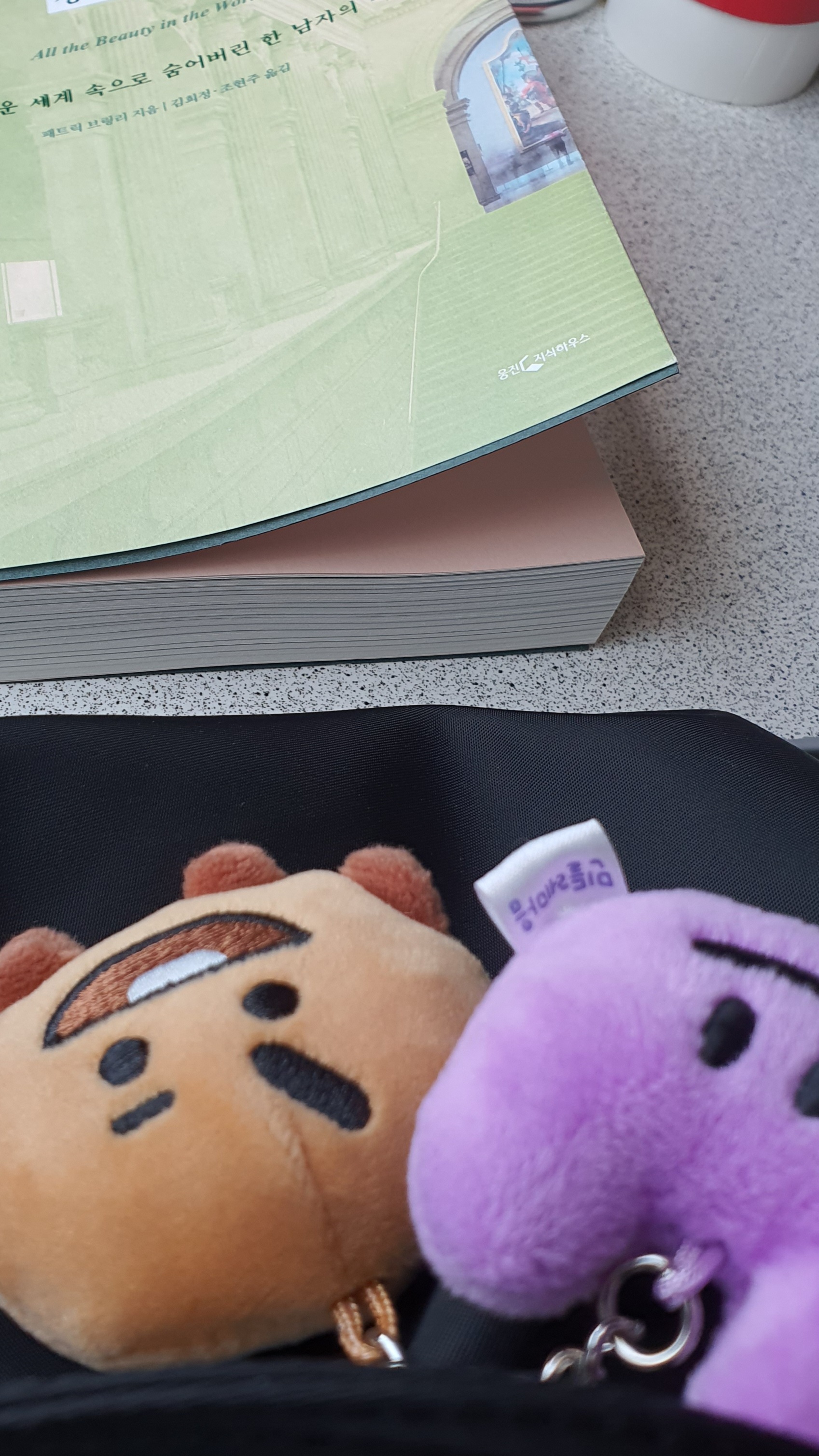
요즘 내 문장에 찰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도가 너무 낮네. 이후에는 소설을 좀 읽어야겠다. ktx에서 옆 사람이 청량마요 먹태깡 먹는 냄새가 너무 역해서 순간 멀미할 뻔했다. 배 말고는 멀미 안 하는 새럼인데! 환기 안 되는 공간에서 냄새 심한 거 못 먹게 했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너무 피로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좋아하는 걸 더 오래 좋아하려면 이런 적폐들은 계속 까발려지고 바로 잡혀야지 그게 맞지 싶고. 피곤하네. 하2브 얘기 하는 거 맞다.
ktx를 타고 있다가 생각했다. 나는 대체로 만나러 가는 사람이네, 하고. 지방에서 지내는 이들과 만날 땐 대부분 내가 움직인다. 서울에서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지. 매일 일을 하기 위해서도 짧지 않은 거리를 움직인다. 매거진, 엔터, 출판사, 학교, 미술.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도 부지런히 걸어가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면 놓여 있는 트레이드 밀 위에 기꺼이 운동화를 갈아 신고 올라가 뛰기 시작했다. 나는 닿고 싶은 곳이 있으면 기꺼이 길을 나서는 사람이다. 마음에 드네. 다음은 어디로 누구를 만나러 가볼까.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레지나 코르디움>이 정말 예뻤고, 앙리 조지프 아르피니의 <산골짜기>는 보는 순간 주변의 온도가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저물어가는 해는 코끝을 찡하게 했고. 시대 구분이 가벽의 페인트 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상주의 태동의 경계에 있던 외젠 부댕의 작품이 두 색의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나란히 걸린 게 인상적이었다. 알프레드 시슬리의 <브뇌 강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과 톤, 햇빛의 점도로 이뤄져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다. 모네의 <봄>은 그림 앞에 서서 작품 제목을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미소가 지어졌다. 지금이 봄이라 그런가 봐. 앙리 르 시다네르의 <강 앞 창가>는 보는 순간 헉, 했다. 점묘와 인상주의의 경계에 놓인, 낮은 온도의 작품.
고흐의 목탄화 위에는 이런 글귀가 놓여 있었다. "I am seeking, I am striving, I am in it with all my heart." all my heart,라니. 고흐 안 좋아하는 법 모름. 진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에두아르 뷔야르의 <모성>은 다색 석판화의 매력을 깨닫게 해줬다. 인상주의 이후 장식적 사실주의, 리얼리즘 파트에 있던 로댕의 <이브>는 등 근육 묘사가 섬세했고, 부럽네. 워너비. 왜 그가 친했던 인상주의가 아닌 그 이후의 파트에 작품이 놓여 있는지도 좀 궁금했다. 20세기 초 서양미술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했다는 그 부분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
피카소의 파스텔화 위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I am always doing that which I cannot do, in order that I may learn how to do it." 앞서 본 고흐의 멘트와 함께 정돈된 인생 모토로 삼아볼까 싶었다. 뛰어들어서 사랑하는 것. 알베르 글레이즈 <여이ㄴ의 초상>은 일본인 느낌이었지만 매력적이었고, 로저 프라이의 <버네사 벨의 초상>은 그의 다른 작품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버네사 벨의 <여러 가지 꽃들>을 보면서는 방금 본 로저 프라이의 작품 속 인물과 같은 인물인지 궁금해졌지. 또 마침 진짜 여성 작가가 없네, 하던 차에 만난 작가라 반갑기도 했다. 로널드 브룩스 키타이의 <인생의 빨간색>은 여러 클리셰적 맥락이 떠오르며 다음 장면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림이라 재미있었다.
진짜 정직하게,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다 있었던 전시. 이 전시는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 컬렉션이기도 했는데 마지막 공간에는 20세기부터 현재까지 남아프리카 예술계 작품들이 놓여 있었다. 마치라잌 박찬욱, 손흥민, BTS, 뫄뫄 렛츠 고,처럼 모네, 앤디 워홀, 남아프리카 예술 렛츠 고, 의 느낌이었다. 이걸 위해 달려온 것 같은 너낌적인 너낌. 하지만 흥미로웠지. 조지 펨바의 <죄송해요, 부인>은 당대 흑인 노예들의 초상인가 싶었고 쉘비 엠부시 <도시의 척도>는 출퇴근 길 직장인들의 표정 같았다. 맞지, 그게 도시의 척도지. 글래디스 므구들랜들루 <파란 옷의 세 남자>와 <숲을 가로질러 달리는 두 소녀>는 보자마자 웃음이 났고, 알렉시스 프렐러 <여사제들>은 아프리카와 이집트 스타일이 믹싱된 느낌에 표현이 디테일해서 어떤 세계관 속 한 장면일지 궁금해졌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의 설립자는 플로렌스 필립스 부인이었다. 런던에서 미술관을 보고는 예술이 유용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고국에도 미술관을 건립했다고. 어떻게 자본을 모은 사람인지 궁금해졌고, 부인이 세웠음에도 출구 나가기 직전 가장 하이라이트 벽면에 남편 초상이 떡하니 걸려 있는 것에서 좀 빈정이 상했다.


















S 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소설을 읽으면 나에게 질문하고 생각하게 되어서 문장에 찰기가 도나, 하는 데에 생각이 이르렀다. 우리는 죽음의 거대한 형상인 무덤을 바라보며 삶과 죽음과 존엄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반기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고 하반기에는 존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확립해 보기로 했다. 프라하에서의 짧은 인연이 지금도 이어진다는 게 고마웠고, 그때의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과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게 기뻤다.
공익적인 일,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S 씨는. 한 달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경주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을 속상하게 한다고도 했다. 자신은 칭찬받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 목표, 지향을 공유했을 때 너무 이상적이라고만 치부해버리는 게 속상하다고.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된다고.











나에게 도시는 대체로 사람으로 치환된다. 이제 나의 프라하와 경주는 모두.
_
기꺼이, 뜬구름을 잡고 결국에는 그것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되어봐요, 우리.
'TEMPERATU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더위와 웨이팅의 균형을 맞춰준 달다구리와 잦은 친절 (0) | 2024.06.12 |
|---|---|
| 거대한 식물원 온실 같았던 도시의 첫인상 (0) | 2024.06.12 |
| 20221208-10_내년에는 서로 고비를 잘 넘기고 만나자, 우리 (0) | 2022.12.10 |
|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집이다 (0) | 2020.03.08 |
| 오름과 검은모래, 그리고 과자 (0) | 2020.03.08 |




